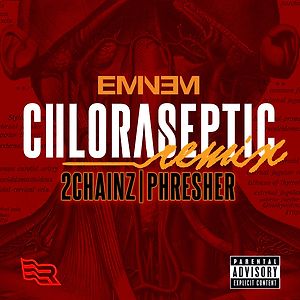'The show must go on.'
직역하면 '쇼는 계속돼야 한다.' 지만, 요즘은 관용적 표현으로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주저하고, 조금 틀어졌다고 멈추기를 반복하면 도대체 언제 그 일이 마무리 되겠는가.
보통의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입 아프게 저런 말을 왜 할까 싶은 문장이다.
허나, 죽는 날 까지 음악에 몸을 바치던 불세출의 가수가, 본인의 죽음이 코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내지르는 비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The show must go on.'
너무도 당연해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던 한 문장이
순식간에 비장함이 더해지고, 처절함이 더해진다. 외에도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문장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몸은 상할 대로 상한 그가 독한 보드카를 들이켜며 "Let's f***ing do this." 라고 뱉으며 노래를 시작할 때, 과연 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죽기 직전까지 노래가 하고 싶다던 그가, 본인의 몸이 무너져 가는 걸 느끼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김현식 선생님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가사마저 너무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감정이 배어드는 곡이라서,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 버린다.
가장 슬펐던 부분은 2절 훅이 끝나고 나오는
My soul is painted like the wings of butterflies. Fairy tales of yesterday will grow but never die.
I can fly, my friends.
라는 부분이다.
이 곡은 '떠나는 자'가 부른 노래이다.
show must go on이라 말하다 갑자기 본인의 영혼은 나비의 날개의 색을 하고 있고, 지난날의 동화들은 자라기만 할 뿐 죽지 않는다고, 본인은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한다. 저승이니, 극락이니 말은 많지만, 그 모두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며 살아있는 모든 자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린 흔히들 '죽음은 산 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하곤 한다. 죽음의 너머엔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감당해내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
화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본인의 주변인에게, 이 노래를 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너희 show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나는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희망의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것이 느껴져서
I can fly, my friends라는 부분에선 내 숨이 끊기는 기분이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진 감정의 크기가 이렇게도 큰데, 본인이 느낀 감정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
살면서 좌절이 내게 다가올 때 항상 주저하고 도망만 쳐왔다.
죽음이란 좌절을 앞에 둔 자도 이렇게나 용감했는데, 나는 그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만 친 걸까.
낭떠러지가 한 발 뒤에 있는지, 서너 발 뒤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던 내게 정말 커다란 충격을 선사해준 구절이다.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염원대로 그의 쇼는 현재 진행형인듯하다.